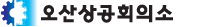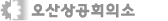|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F1 더 무비'의 열기가 가을바람에도 식을 줄 모른다. '가을의 전설' 브래드 피트의 변치 않는 수려함과 더불어, 8000만명의 드라이버 중 1명만이 트로피를 거머쥐는 감동 서사에 N차 관람이 늘고 있단다.
문득 기업 생태계가 떠올랐다. 한국의 중소기업 수가 대략 102만개다. 이 중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0.04%라 한다. 그럼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1.4% 남짓이다. 결국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 100만개 기업 중 4개 기업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다. 이런 '대'기업을 '대단한' 기업이라고 부르고 싶다.
성장의 길에는 수백 개의 '규제 넝쿨'이 도사리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지주회사의 자금 모집 금지, 지주회사 전환 의무 등 규제가 94개로 늘어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되면 기업집단 공시 의무, 준법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 최대 343개의 규제가 생긴다. 경제 관련 법안 12개만 조사해 집계한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장 포비아'를 겪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중소기업은 졸업을 피하기 위해 분사나 상시근로자 조정 같은 '기업 쪼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때 받던 혜택이 그리워 '자발적 다운사이징'을 하는 중견기업도 있다. 상법 적용이 거세지는 '2조원' 문턱에서 '계획된 정체'를 시현하는 대기업을 탓할 수 있을까. 수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해봤자,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 보상과 격려 대신 커다란 규제 부담이니 기업들이 저마다 성장을 주저하는 것이다.
해법은 다시금 '성장 유인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기업의 크고 작음이 정책자원 배분과 규제 적용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지금 같은 성장 정체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한국 기업이라지만 실상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도 많다. '자승자박' 규제 환경이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현실적으로 수백 개의 계단식 규제를 한꺼번에 모두 풀 수는 없다. 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 첨단산업군에 한해서라도 예외 적용을 두는 방안 역시 검토할 만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예외 조항을 삽입하는 식이다. 또한 최근 조성을 논의 중인 RE100 산단, 메가샌드박스 지역에서 차등 요인을 완전 배제하고 성장 기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다루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규제가 왜 생겼는지'만 따지고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규제의 산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상실했거나, 과도하게 시행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성장 포비아'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진짜 성장'을 표방한 정부 아닌가.
|